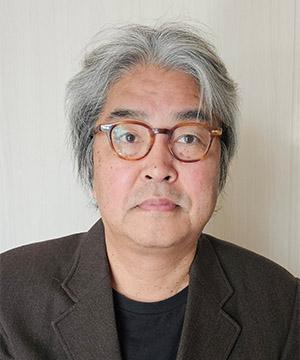
‘문질빈빈(文質彬彬)’은 『논어』의 ‘옹야’ 편에 나오는 말이다.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질승문즉야, 문승질즉사, 문질빈빈 연후군자)’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질(質)이 문(文)을 이기면 야(野)하고, 문이 질을 이기면 사(史)하다. 문과 질을 고루 갖춘 뒤에야 군자(君子)라고 할 수 있다”가 된다. 야(野)는 꾸밈이 없어 거칠고 투박하다, 사(史)는 그럴듯하게 꾸민다는 뜻이다.
문질빈빈은 문과 질을 두루 갖춰 훌륭하다는 말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문은 형식·현상·기(氣), 질은 내용·본질·리(理) 등의 의미로 이어진다.
옛 한자에서 문(文)은 문(紋·꾸밈)과 통했다. 문(文)은 인간이 지닌 지각 영역에서 역할을 찾는다. 인간사의 이해와 소통은 대개 문의 영역 안에서 이뤄진다.
질(質)은 지각을 벗어난 곳에서 기능하려 한다. 질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리(理)와 닿는다. 질과 리는 인식의 영역에서 본질적 기능을 드러내며, 그 기능은 인간사를 떠난 자연계나 물질의 탐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질이 리까지 통한다는 건 근대를 개척한 서양의 경우다. 공자가 원래 품었던 뜻과는 다르다. 동양에선 질에 관한 해석과 응용이 소극적이었다. 본질의 엄정한 추구는 빼고, 질은 곧 내용이라는 정도에 머물고 만다.
우리나라 고교와 대학에서 문과, 이과라는 분류가 있었다. 일본에서 서양의 학문과 교육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문과, 이과로 분류한 데서 영향을 받았다.
이과(理科)의 리(理)는 라틴어 라티오(ratio)에서 나온 말이다. 메이지유신 이전에 네덜란드로 유학 갔던 일본의 철학자 니시 아마네(西周·1829~1897)는 라티오를 이성(理性)으로 번역했다. 이퇴계가 열중했던 주자학의 기본 개념인 리(理)를 라티오의 번역에 응용한 셈이다.
‘라티오’는 하나 혹은 전체를 공정하게 여러 개로 나눈다는 의미다. 리(理)에도 ‘나눈다’는 뜻이 있다. 분석과 환원이라는 근대과학의 기본 태도가 리에 담겨 있다. 물상과 물질을 분석하면 물리가 되고, 마음을 분석하면 심리가 된다. 이는 사물과 사태를 하나로 뭉뚱그려 감각의 떨림으로만 수용하려는 문(文)의 세계를 넘어선 영역과 질서를 향한 궁리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수학적 질서에 다다른다.
미술은 문(文)의 영역이다. 문(文)이 문(紋)과 통한다면 미술이 가장 적절한 경우가 될 것이다. 미술은 감각과 지각을 중시한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색깔, 물성 등이 우선한다. 감각과 지각만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흥분하기가 쉽다.
근대 이후 서양 미술에는 질(質)과 리(理)의 세계를 다루는 미술도 발달했다. 대표적 예로 ‘미니멀 아트’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 미술가는 수학적 질서를 가진 미니멀 아트 앞에서 곤혹스러워한다. 근대적 인식의 세계가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는 일인칭의 표현이 극도로 자제된 엄정한 기하학적 구조의 미니멀 아트가 너무 밋밋해 보인다. 흥분하고 싶은데 흥분할 수 없어 다른 흥분을 찾는다.
미술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차분한 수학적 질서의 인식을 도외시하고 감각의 흥분에만 열중하고 있다. 문질빈빈이 아닌 허장성세의 흥분뿐인 불안정한 문빈(文彬)의 사회다. 문질빈빈을 넘어서 감각과 이성을 두루 갖춘 문리빈빈(文理彬彬)의 사회로 도약해야 한다.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