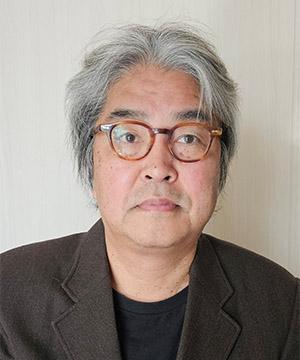
파리, 모기가 웃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침팬지는 웃는다. 사람은 더 잘 웃는다. 하등동물에게는 없는 웃음이 고등동물에게는 있다. 그런데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남을 웃길 줄도 모른다.
웃음의 가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동양에서는 웃음의 가치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근대 이후의 서양에선 웃음을 교양으로 간주한다. 웃지 않는 이는 사회적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잘 웃는 사람을 존중하고 적절한 시점에 남을 웃길 줄 아는 이를 고도의 교양인으로 여긴다.
최근 한국에도 웃음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직업적으로 웃음을 생산하는 사람을 코미디언 혹은 개그맨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이들 직종의 사람을 그리 존경하지 않았다. 요즘 들어 코미디언, 개그맨은 고소득에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직종이 됐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웃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웃음은 건강에도 좋다. 상대방의 긴장을 누그러뜨려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과잉의 긴장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를 만나면 쓸데없이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웃음이 없는 살벌한 공동체에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런 개인과 공동체일수록 절실한 건 웃음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상징의 소유에 있다.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기호, 몸짓 등을 말한다. ‘평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하얀 비둘기’란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된다. 하얀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되는 셈이다. 개념적인 인식의 세계를 구체적인 지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 인간은 상징을 창안했다.
웃음은 상징의 교환에서 나온다. 개인에 따라, 공동체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상징체계를 가진다. 웃음이 나오는 순간은 상대방과 나의 상징체계가 살짝 미끄러질 때다. 2개의 상징체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고 멀뚱멀뚱한 상태가 된다. 2개의 상징체계가 하나인 것처럼 딱 붙어 있으면 상징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에 아무런 웃음도 나지 않는다.
서로가 같은 상징체계를 가진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고 계속 미끄러질 때 지각과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엉뚱하고 묘한 감각이 발생한다. 평화를 상징한다고 여겨졌던 ‘하얀 비둘기’가 아닌 ‘뚱뚱하고 시커먼 닭둘기’가 등장할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감각, 상식을 뒤집는 낯선 감각이 돋아난다. 무섭게 생긴 뚱뚱한 닭둘기는 탐욕에 더 가까운 비둘기, 심지어 평화가 아닌 악을 상징할 수도 있는 비둘기다. 그동안 익숙했던 상징체계의 전복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슬며시 나오는 웃음이 상징의 미끄러짐이 유발한 간지러움이라면 폭소는 상징체계의 급격한 전복이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지역은 미끄러짐을, 또 어떤 지역은 전복을 선호한다. 전복의 웃음에 익숙한 사람은 미끄러짐의 웃음에 반응이 둔하다. 미끄러짐의 웃음을 선호하는 이는 전복의 웃음에 부담을 느낀다. 타인의 웃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제대로 반응하는 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엄근진(엄숙, 근엄, 진지)’이었던 한국 사회는 이제 웃음을 높이 평가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웃음을 알고 상징을 다룰 줄 아는 근대적 인간들이 공동체의 주축을 이루는 세상으로 변모 중이다.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