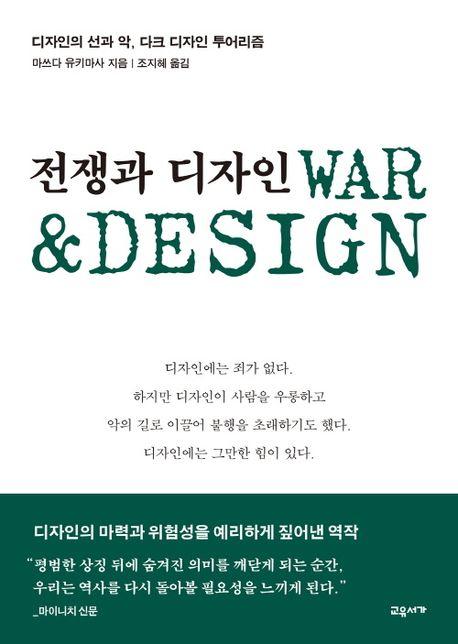전쟁과 디자인
|
전장 한복판에 디자인이 있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일상에서 접하는 디자인이 전쟁 무기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국기의 색과 문양부터 군복 디자인, 선전 포스터, 상징적인 로고와 구호까지 디자인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국가의 이념을 전달하며 때로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은 분명 바뀔 것이다.
저자는 전쟁과 선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집중한다. 특히 ‘디자인은 죄가 없다’는 명제 아래 디자인의 힘과 책임을 토론한다.
이를 위해 중세 십자군 원정부터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이 전쟁을 조장·선전했던 방식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방대한 도판자료를 담았다.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유대인 탄압에 쓰인 ‘다윗의 별’, 블라디미르 푸틴의 Z마크 같은 상징은 디자인이 전장의 전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증거다.
또한 전쟁 속 디자인을 색·상징·언어·이미지로 각각 나눠 분석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정치·사회적 메시지에 주목한다.
‘핏빛 붉은색’은 노동자 해방을 상징하다가 공산혁명의 색채가 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방어처럼 포장했다. 이처럼 디자인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심리전의 무기였으며,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작동해 왔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과거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디자인이 권력의 언어로 사용된다는 것을 짚어 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광고, 캠페인, 국가 이미지 속에서 여전히 반복해 전쟁의 언어를 마주하고 있으며 무심코 받아들이는 이미지와 말에 담겨 있는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핵심은 디자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다.
전쟁과 디자인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독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상징·문장 뒤에 감춰진 뜻을 찾아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익숙한 디자인 속 진짜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김세은 인턴기자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