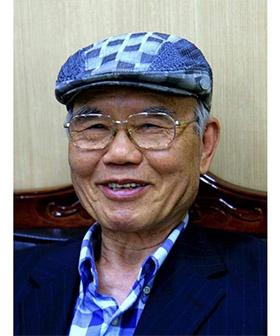
해마다 유월이 오면
짙붉은 장밋빛 울음이
장대비로 쏟아진다
지난날, 밀어닥친
해일의 발굽 아래
짙푸른 대지 피 토하던
유월이 오면
동작동 구릉을 날아드는
흰 소쩍새들, 차가운
돌비석만 어루만지다가
이 골짜기
저 능선 쓰다듬다가
소쩍소쩍 흐느끼며
흐르는 구름 한 점
동공에 담는다
잊혀지는 기억 속으로
해마다 연년이
유월이 오면
동공에 가득한 구름만
가슴 저며내는 한이 되어
짙붉은 장대비, 하염없는
소쩍새 울음이 된다
강물이 된다
<시 감상>
이 시에서 유월은 아픈 기억이다. 시인은 6·25전쟁의 참상을 “지난날, 밀어닥친 /해일의 발굽 아래 /짙푸른 대지 피 토하”는 모습으로 묘사한다. 그 고통을 사람의 몸으로 변환시켜 전쟁의 잔혹함을 구체적인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아픈 기억은 잊히지 않는 것이어서 “해마다 유월이 오면” 동작동 “차가운 돌비석만 어루만지다가” “구름 한 점 /동공에 담는” 누군가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비친다. 보통 일인칭 ‘나’로 대변되는 시적 화자(또는 주체)를 누군가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그 유월의 기억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기억이어야 한다는 암시(소망)처럼 보인다.
원래 유월은 24절기 중 ‘망종’이 있는 달이다. 망종은 보리 수확과 모내기를 마치고 조상과 신에게 감사의 제를 올리고, 새로운 풍년을 소망하는 풍속이 있었다. 1956년 6월 6일 망종일을 현충일로 지정한 건 이러한 풍습이 이어진 것이다. 순국선열을 향한 감사, 새로운 출발의 다짐과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다. 순국영령들의 희생이 매년 공작지(국립서울현충원 내 연못)에서 새롭게 피는 연꽃처럼 역사의 넋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마음(소망)처럼. 차용국 시인·문학평론가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