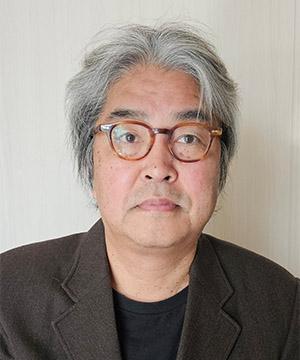
요즘 부쩍 ‘아티스트’라는 낱말의 사용 빈도가 늘었다. 이 말이 뭔가 멋있어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티스트는 16세기 이후, 즉 근대와 함께 등장한 단어다. 그전에는 ‘아티피셔’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오늘날의 ‘아티스트(예술가)’와 ‘아티잔(장인)’을 아우르는 낱말이었다. 예전에는 예술가와 장인의 구별이 없었다. 예술작품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란 말에는 독립되고 개인화된 인간의 주체성이 은연중 강조되고 있다. 공동체 사회에서 독립한 개인, 이 얼마나 멋진 경지인가.
아티스트와 아트피셔의 차이를 알려면 먼저 아트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연스러움에서 태어나 자연스러움 속에서 살아간다. 자연스러움(내추럴)은 자연(네이처)에 인공(아티피셜)이 더해진 상태를 이른다. 이 인공(아티피셜)의 행위와 결과를 ‘아트’라고 한다.
야생의 동물은 순수하게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 이와 달리 인간은 인공이 더해진 자연, 즉 자연스러움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다. 그 증거는 일상생활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삶을 기본적으로 지탱하는 옷, 음식, 집 등 의식주부터가 일종의 인공이다.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 역시 모두 인공이다. 요즘은 의식주와 생필품의 인공을 넘어 지능의 인공 세계로까지 진입했다.
원래 아트는 매우 단순한 뜻을 지녔다. 인간에게 유용한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일컬었다. 예를 들면 돌도끼도, 흙으로 만든 그릇도 다 아트다. 짐승을 잡거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유용함이 있다. 그런데 동굴 벽화는 어디에 유용한 걸까? 또 난해한 현대미술은 어디에 유용한 걸까? 동굴 벽화는 사냥의 기록이나 많은 수확·다산을 기원하는 그림이라는 설이 있다.
이 그림은 어느 정도 유용한 데가 있다. 입체파의 한 사람인 피카소의 그림은 어디에 유용할까? 코와 눈이 제자리에 붙어 있지 않다. 인물의 기록으로 보기엔 사실성이 전혀 없다. 아무리 봐도 유용함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런 무용의 아트를 실행하는 자를 ‘아티스트’라고 한다.
아트가 유용함을 계속 담고 있는 걸 기술이라고 부른다. 아트의 어원인 라틴어 ‘아르스’는 그리스어 ‘테크네’를 번역한 말이다.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인데 오늘날엔 ‘유용(有用)’한 아트는 테크네로, ‘무용(無用)’한 테크네는 아트라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움(내추럴)의 세계는 과거처럼 자연과 유용의 아트와 결합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유용의 아트, 여기다 무용의 아트까지 다 합쳐진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인간은 의외로 무용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놀이, 지적 호기심, 사람들과의 소통, 웃음, 신뢰 등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에는 무용이 빚어낸 게 많다. 무용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무용을 잘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높은 수준의 문화와 함께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많은 젊은이가 음악·미술·무용 등 고전적인 아트 장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가령 유용의 아트라고 할 수 있는 빵집·식당 등에서 일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무용의 아트를 지향하는 ‘아티스트’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음은 고무적이다. 아티스트라는 명칭을 쓰고 싶어 하는 만큼 삶이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