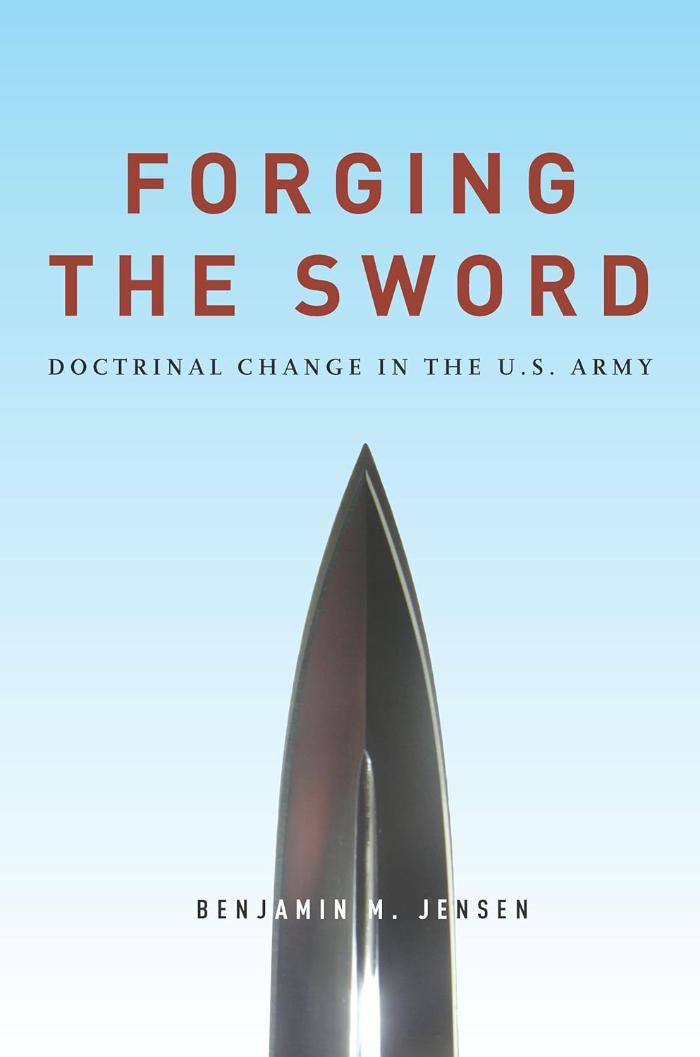현대 군사명저를 찾아서
벤저민 젠슨의 『미 육군의 교리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능동적 방어’에서 ‘공지전’으로
‘전영역 작전’서 ‘대분란전’으로
베트남전쟁 이후 네 번 혁신적 변화
새로운 생각 배양할 수 있는 ‘발양조직’
개념 확산 위한 지지와 공감으로 가능
Benjamin M. Jensen. 2016. Forging the Sword: Doctrinal Change in the U.S. Army.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16.
거대한 관료조직인 군대는 원래 개혁에 저항적이다. 대부분의 일은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교리(doctrine)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1945년 미 육군은 핵심 교범인 『Operations』를 무려 열네 차례 수정했다. 베트남전쟁 이후 혁신적 변화를 담고 있는 것만 네 번이나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
‘이상하리만큼 빈번한’ 교리 수정
미 해병대 대학에서 전략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장 학자 벤저민 젠슨은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미 육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질문한다. 미 육군은 ‘능동적 방어’(1976)에서 ‘공지전’(1982) 개념으로, 그리고 탈냉전 상황에 부합하는 ‘전영역 작전’(1993)에서 ‘대분란전(2006)’ 개념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추동해 왔다. 관료제의 철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군 조직 특성을 인식할 때 ‘이상하리만큼 빈번한’ 교리 수정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변화와 작전 개념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를 떠나 짧은 시간에 이 같은 혁신을 이끌어낸 원인과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추동할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리 변화와 같은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요인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었다. 외생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들은 전쟁의 패배, 민간 지도자의 개입, 국제정세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강조한다. 새로운 전쟁이론으로 무장한 군 엘리트의 조직적 노력이나 전략문화 같은 내생적 요인을 지적한 연구자도 있다.
저자는 이러한 설명들은 군사혁신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미 육군의 교리 변화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 육군의 교리 혁신은 대부분 군 내부에서 발양돼 확산했기 때문이다. 그는 교리를 “군 전문가들이 국가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결정적인 임무의 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 전환”으로 정의하면서, 교리의 변화는 주로 군 내부의 새로운 지식 창조와 확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한다. 즉 외생적 변수보다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맞춰 작전개념을 수정하고자 하는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토대는 전문가주의
새뮤얼 헌팅턴이 강조했듯이, 미군은 오랜 전문가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시한다. 다른 전문가와 달리 군사전문가는 국가안보의 소명을 지닌 사람들이다.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외부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외생적 변수의 개입이 없더라도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문제지향적 탐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러한 안보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의 생각들이 개념으로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교리, 새로운 승리이론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리 혁신은 외부 환경 변화라는 외생적 요소와 내부의 지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4개의 사례를 통해 실제 교리의 혁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엄밀히 추적한다. 여기서 그는 두 개의 중요한 계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는 새로운 생각을 배양할 수 있는 ‘발양조직(incubator)’의 존재다. 이 조직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이 안전하게 실험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뜻한다. 공식적 위계 밖에서 장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통적 관료제의 경직성과 제약을 벗어나 군 내부의 전문 집단이 창의적으로 미래 전쟁을 상상하고 새로운 작전 개념을 구체화하는 혁신적 사고의 ‘안전지대’와 같은 곳이다.
|
발양조직과 지지의 연결망
미 육군이 허용한 대표적 발양조직은 TRADOC(훈련교리사령부) 산하 연구 그룹, 비공식 워게임, 야전훈련, 소규모 연구 조직 등이다. 이곳에서는 기존 교리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전투 경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참신한 전쟁 개념을 시험할 수 있었다. 여기서 공지전 개념이나 전영역 작전 개념이 도출됐다.
다른 하나는 ‘지지 연결망(support network)’의 역할이다. 어떤 개념이 확산되고 지지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이들의 연결망이 존재해야 한다. 이를 군 지휘부, 정치권, 학계, 언론, 심지어 동맹국을 연결해 ‘전염성 강한 서사’로 전환시킨다. 즉, 교리 변화가 군 조직 내부에서만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지와 공감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1976년의 적극적 방어 개념은 발양에는 성공했으나 옹호세력 확보에선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1982년 공지전 개념은 돈 스태리 장군이 군사 전문지 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훈련, 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폭넓은 지지세력을 형성한 덕분에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고위 장교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역할(brokerage)이 필요하다. 이들이 군과 언론, 사회, 정부와 연결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념을 기존 통념과 결합(yoking)함으로써 정당성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2006년 대반란전 교리에서 “마음을 잡는 일”의 중요성을 확산시켰다. 이는 베트남전쟁의 교훈과 연결되면서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지지 연결망은 교리 변화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내부의 소통 채널
지지 연결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미 육군의 『Military Review』나 미 해병대의 『Marine Gzaette』와 같은 내부 소통 채널(잡지)이었다. 다양한 생각과 개념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작전 개념이 발양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 또 고위 장교들도 이러한 잡지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전함으로써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됐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대한 관료조직인 미 육군이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교리 혁신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주의 전통에 기반한 자율적 발양조직, 그리고 지지 연결망의 활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과 미국은 너무 다른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은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군 조직이 내부적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주의에 기반한 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교 개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