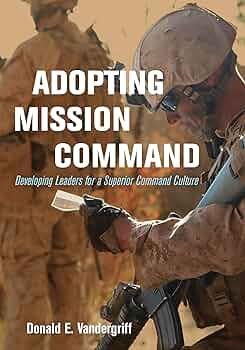현대 군사명저를 찾아서
도널드 밴더그리프의 『임무형 지휘: 탁월한 지휘문화를 위한 지휘관 양성』
Donald E. Vandergriff. 2019. ‘Adopting Mission Command: Developing Leaders for a Superior Command Culture’. Naval Institute Press. pp. 328.
독일군 임무형 전술을 이상적 모델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훈련 강조
미 육군의 절차 중심 형식적 교육 비판
교관 아닌 교사로 임무 역량 개발 선행
우드 장군 유연한 전투구조 전장 주도
임무형 지휘는 1982년대 공지전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사용된 용어다. 40년이 지났지만, 유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임무형 지휘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도널드 밴더그리프는 미 육군이 주장하는 임무형 지휘가 여전히 형식적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
산업화 시대의 지휘문화
저자 밴더그리프는 미 해병대와 육군 장교 출신으로, 다년간 임무형 지휘와 리더십 교육 분야를 연구해온 실천적 학자다. 그는 이 책에서 독일군의 ‘임무형 전술(Auftragstaktik)’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며, 탁월한 지휘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성과 중심의 자율적 지휘관을 위한 교육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책의 초반부는 임무형 전술
임무형 전술의 역사적 기원과 철학적 기초를 다룬다. 독일군이 프러시아 시절부터 어떻게 하급 지휘관의 창의적 결단과 주도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반면 미 육군은 1899년 개혁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산업 시대적 효율성과 표준화를 군 지휘 체계에 이식했다.
미 육군 훈련교리사령부(TRADOC) 설립 이후 교육과 훈련 역시 정형화된 절차 중심의 형식적 교육으로 고착됐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이를 ‘공장식 리더 양성’이라고 표현하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장 환경에서는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 육군이 지휘관 교육에서 지나치게 ‘정답 찾기’식 문제 풀이에 의존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전장에서는 하나의 정답을 숙달하는 것보다 수많은 불확실한 변수 속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방식은 절차적 숙달(process-oriented)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창의적 사유를 위한 동기부여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성과 기반 훈련 및 교육(Outcomes-Based Training and Education)’과 적응형 교육과정(Adaptive Course Model)을 제시한다. 절차나 과정의 숙달보다는 상황에 적응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세부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전술 결정게임(Tactical Decision Games), 워게임, 자유대련 훈련(Free Play Exercise)을 강조한다. 초급지휘관을 이러한 교육에 몰입시켜 불확실한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탁월한 지휘관으로 양성하자는 것이다.
|
조직문화적 변혁으로 이어져야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임무형 지휘 문화를 단순히 지휘 철학이나 전술적 기법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조직문화 전반의 변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임무형 지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교관이 아니라 ‘교사(teacher)’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역량 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장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지휘관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즐기는 문화’를 체득하게 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다.
미 육군이 임무형 지휘를 명문화하고도 현장에서 실질적 적용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리적 혼란 때문이 아니라 리더십 양성 체계가 철저히 산업 시대적 사고방식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군인들도 공산품의 부품처럼 교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순응과 관리’를 중시하는 인사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순응과 복종의 분위기에서는 ‘자기 주도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임무형 전술적 사고방식이 내면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존 셜리 우드 장군이 이끄는 미 육군 4기갑사단 사례를 통해 임무형 지휘 문화의 성공적 구현 사례를 보여준다. 우드는 탱크와 보병의 영구적 배속을 지양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부대를 재편성하는 ‘유연한 전투구조’를 통해 전장을 주도했다. 이는 명령의 간소화와 현장 지휘관의 재량 확대를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 저자는 이를 통해 임무형 지휘는 평시 교육과 훈련, 인사관리, 문화적 가치관이 모두 일치할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보다는 사람 중심의 접근
물론 약점도 있다. 저자는 임무형 전술이 미 육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논지를 전개하고 있지만, 문화·조직적 환경이 상이한 미국과 독일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특히 임무형 전술이 가능했던 독일군의 사회문화적 조건과 이를 뒷받침한 구조적 특성에 대한 고찰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현대전의 복잡성과 대규모 합동작전 환경에서는 일정 수준의 중앙집권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임무형 지휘를 구현할지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임무형 지휘의 도입이 단순한 교리상의 전환이 아닌, 조직문화 전반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귀중한 통찰을 전해준다. 비록 일부 역사적 사례의 선택적 해석과 현대전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저자의 문제의식과 대안적 교육방법론은 미 육군뿐만 아니라 임무형 지휘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 군대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기술이 아닌 사람(리더십 개발)’에 집중하는 접근법은 정보화 시대의 전장 환경에서 더욱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한국군 역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명제임에 틀림없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