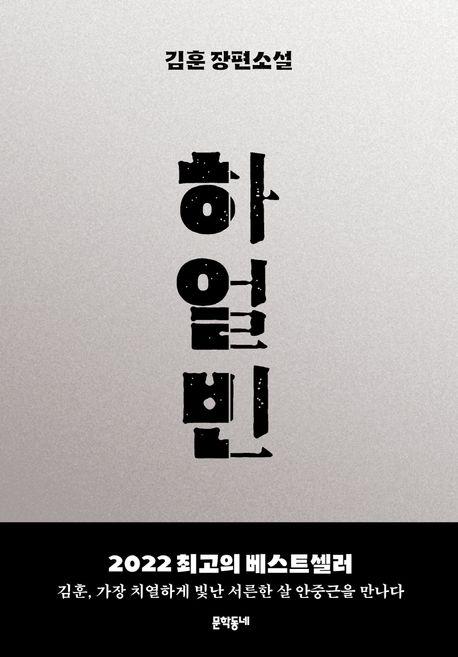『하얼빈』을 읽고
|
|
해군의 모항 진해 1정문에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이라는 말이 뚜렷하게 새겨진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있다.
이는 안중근 의사의 말이란 것을 대다수가 알고 있지만 이 글의 탄생 비화를 김훈 작가의 『하얼빈』에서 볼 수 있었다. 『하얼빈』은 1908년 1월 고종의 아들 이은이 태자태사(太子太師)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끌려와 일본 왕 메이지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해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사형 집행 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안중근 의사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통해 해군의 핵심 가치인 ‘명예’ ‘헌신’ ‘용기’를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명예’는 군인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군인답게 사고하는 자세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사살 건의 재판 중 최종진술에서 “나는 한국 독립전쟁의 의병 참모중장 자격으로 하얼빈에서 이토를 죽였다. (중략) 전쟁에서 포로가 됐기에 자객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변호했다. 안중근 의사 개인으로서 이토를 사살한 게 아닌 독립전쟁 차원의 거사였음을 계속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헌신’은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자세다. 안중근 의사는 신문 시 본인의 직업을 포수라고 했다가 기소 후 무직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종진술 때 본인을 독립군 참모중장이라고 말한 것은 그 어떤 위력에도 기대지 않고 한국의 독립을 위함이 드러난다. 옥중에서 『동양평화론』과 『안응칠 역사』를 저술한 점 또한 안중근 의사의 헌신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로 사형을 당하게 된 안중근 의사는 집행 당일인 1910년 3월 26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는 뜻을 담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강조했다. 이는 안중근 의사의 국가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용기’는 어떤 역경에서도 임무를 올바르게 완수하는 기상과 당당한 자세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가 만주를 시찰하고,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 단지동맹을 맺었던 독립지사들과 하얼빈 의거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토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은 덩치가 작다는 것, 많은 러시아 군인과 일본 헌병대가 경호할 것이기에 한두 발의 총알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역경과 어려움에도 안중근 의사는 용기를 발휘해 세 발의 총알을 이토에게 명중시키며 ‘이토 사살’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완수했다.
안중근 의사의 생은 군인 그 자체의 삶이었다. 대한민국 군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 정신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