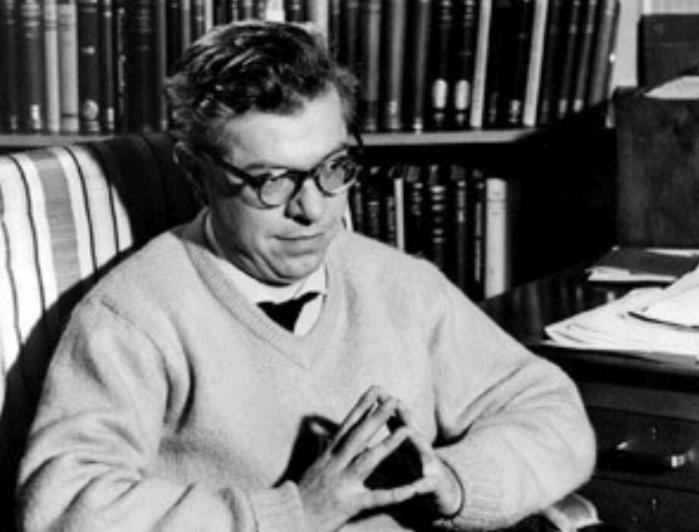안드로메다 통신 - 서경덕의 도술과 빅뱅
“세상은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
조선 유학자 서경덕 ‘이기설’서 주장
“우주는 탄생한 때도 없고 변화도 없다”
영국 과학자 프레드 호일 ‘정상우주론’
현재는 138억 년 전 ‘빅뱅’ 기정사실화
탄생에 관한 이론적 증거 충분히 쌓여
|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왜 생겨났을까? 우주에 가득한 별과 땅과 하늘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고대 인도인들은 먼 옛날 우주에는 거대한 우유의 바다와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휘저으며 ‘아수라’라고 하는 괴물들과 신들이 서로 다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지금과 같은 세상이 생겨났다고 믿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맨 처음 우주에는 온통 알 수 없는 ‘카오스’라는 것이 있을 뿐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처음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저절로 생겨났고 그 가이아가 다양한 신들을 낳으면서 세상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했다. 북유럽 사람들은 ‘이미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있었는데 그 거인이 죽은 뒤에 그 몸이 재료가 돼 온 세상이 생겨났다고 생각했다. 거인의 몸은 산과 땅이 됐고 머리카락은 나무가 됐다는 식이다.
옛 한국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다고 믿었을까? 요즘 몇 가지 알려진 이야기가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무속인을 통해 전해진 ‘창세가’라는 노래 가사에 남아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먼 옛날에 ‘미륵’이라고 하는 거인 모습의 신령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거인이 세상 모습을 지금처럼 꾸몄다고 한다. 그 와중에 하늘에서 떨어진 벌레를 신령이 받았는데 그게 사람으로 변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사실 ‘창세가’는 1920년대에 함경도 지역에서 김쌍돌이라는 무속인이 남긴 이야기다. 1920년대면 이미 한국에 기독교가 자리 잡고 다양한 신흥 종교도 등장한 시기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그 시절 함경도 지역의 무속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민속자료이기는 하지만, 예로부터 많은 한국인이 믿고 있었던 대표적인 신화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그러고 보면 한국에는 세상이 처음 생긴 과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 딱히 널리 퍼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긴 세월 오랫동안 내려온 이야기를 찾기도 쉽지 않다. 중국 고전 등의 영향으로 세상을 처음 만든 조물주라는 것이 있었다는 생각이 한국에도 널리 퍼져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 조물주가 왜, 어떻게 우주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로 한국에서 유명한 것은 드물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있다.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이규보가 쓴 ‘문조물’이라는 글이 있다. ‘문조물’은 조물주에게 묻는다는 뜻인데,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 모기 같은 성가신 생물을 대체 왜 만들었냐고 조물주에게 물어보며 따지는 것이 글의 시작이다. 모기가 많은 편인 한국에서는 여름철이면 누구나 한 번쯤 그 때문에 짜증을 낼 법한데, 1000년 전 이규보는 짜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 떠올린 생각을 멋진 글로 써냈다. ‘문조물’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상당히 알려졌던 것 같다. 본받을 만한 글을 모아 놓은 조선시대 책인 『동문선』에도 ‘문조물’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문조물’에서 조물주는 뭐라고 대답할까? 조물주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그냥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의도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무심코 무엇인가를 만든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을 만든 조물주라면 세상이 왜 생겨났는지, 우주의 의미는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글 ‘문조물’에 나오는 조물주는 자기도 사실 딱히 아는 것은 없다고 말할 뿐이다. 심지어 글 결말에 이르면 조물주는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왜 내가 조물주가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
이렇듯 우주가 왜,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주를 만든 조물주조차도 알 수 없고, 그런 질문의 답은 없는 것 같다고 보는 태도는 한국에서 꽤 인기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조선 전기의 유명한 학자 서경덕은 ‘이기설’이라는 글에서 세상이 생긴다거나 사라지는 것은 없으며 그냥 원래부터 우주의 원리는 지금 같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럴 거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세상에는 오직 ‘기’라는 것이 있을 뿐인데, 기가 모이고 흩어지고 변하며 이런저런 물체가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라고 했다. 누가 우주를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들었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우주의 원리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서경덕은 황진이와의 로맨스에 관한 소문으로도 대단히 유명한데, 한국사에서 우주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 중에 남녀 관계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한 인물도 없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유명한 만큼 서경덕의 학문은 이후 여러 조선 선비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재미있게도, 후대 전설 속에서 서경덕은 도술이 아주 뛰어나 전우치를 꺾은 인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아마도 우주 만물의 근원에 대해 연구한 그의 학문을 두고 많은 사람이 신비하고 놀랍다고 느꼈던 것이 반영돼 ‘서경덕은 우주를 초월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퍼졌던 듯하다. 거기서 그가 도술에 밝았다는 전설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
서경덕의 생각과 비슷해 보이는 발상에 심취한 인물은 현대 과학계에도 있었다. 대표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 영국의 과학자 프레드 호일이다. 그는 우주가 이런저런 현상을 일으키며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 없던 우주가 생긴다거나 우주의 전체 모습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넓게 보면 우주는 큰 차이 없이 그냥 정지한 상태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프레드 호일의 우주에 대한 생각을 정지한 상태 우주론, 즉 ‘정상우주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다른 몇몇 과학자들은 반대로 우주가 먼 옛날 아주 작은 크기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지금 우리 우주가 됐다는 학설을 연구했다. 프레드 호일은 그런 생각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우주가 크게 뻥 터지듯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널리 퍼졌다고 하는데, “크게 뻥”이라는 말이 어지간히 인상적이었는지 나중에는 프레드 호일의 반대파 학자들조차도 우주가 어느 순간 생겨나서 커졌다는 이론을 “크게 뻥 이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영어로 말해서 ‘빅뱅 이론’인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대폭발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농담처럼 만든 말이 역으로 우주의 탄생이라는 심오한 현상에 대한 정식 용어가 됐다니, 세상 돌아가는 것은 참 알기 어려운 것 같다.
따져 보자면, 우주가 탄생한 때도 없고 우주에 큰 변화도 없다는 프레드 호일의 정상우주론은 무척 매력적인 이론이다. 만약 정상우주론이 틀렸고 대폭발 이론이 맞다면 문제가 깔끔해지지 않는다. 도대체 우주가 맨 처음 시작된 대폭발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대폭발로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그러면 반대로 우주가 사라질 수도 있는지 등 어려운 고민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자기가 대폭발을 일으킨 외계인과 통한다고 주장하거나, 대폭발의 반대인 우주가 사라지는 종말의 순간을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따위의 빌미가 될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프레드 호일은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정상우주론이 맞고 대폭발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대폭발 이론이 맞는다는 많은 증거가 충분히 쌓여 있는 상태다. 21세기의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형태의 우주가 바로 대폭발과 함께 탄생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우주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는 호일의 정상우주론은 틀렸다는 게 결론이다. 서경덕과 황진이가 듣는다면 좀 아쉬워할 만한 이야기다.
|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