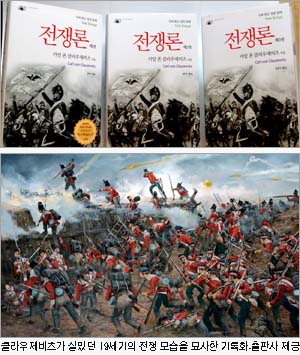
군사학 분야의 고전을 선정할 때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손자병법과 함께 반드시 리스트에 포함되는 책 중의 하나다.
19세기의 군사사상가 골마 폰 데어 골츠는 “클라우제비츠 이후에 전쟁을 논하려는 군사이론가는 마치 괴테 이후에 파우스트를 쓰거나, 셰익스피어 이후에 햄릿을 쓰려는 작가처럼 모험을 무릅쓰는 것과 같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골츠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대해 “전쟁의 본질에 관해 논의돼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군사사상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남긴 작품에서 전형적인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남겼다. 미국의 군사전력가 버나드 버로디는 “전쟁론은 전쟁에 관한 진정으로 위대한 유일한 책”이라고 격찬했다.
이처럼 위대한 평가를 받는 불멸의 고전이 드디어 독일 원전을 기초로 우리말로 완역됐다. ‘아니 전쟁론 번역본을 10종 이상 본 것 같은데 그동안 원전을 토대로 완역한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 지금까지 나온 10종 이상의 번역본은 원전의 완역본이 아니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출간됐던 전쟁론은 내용을 요약하거나 일부 대목만 선별적으로 번역한 전쟁론이었다. 10여 종의 번역본 중에 유일하게 완역본이 하나 있었지만 일역본을 중역한 것이라 독일 원전의 내용과 거리가 있는 것이 한계였다.
대전대학교에서 군사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만수 박사가 전체 3권으로 갈무리출판사를 통해 펴낸 ‘전쟁론’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독일 원전을 완역한 전쟁론이다. 김 박사는 2006년 1권을 번역·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 2·3권 번역을 마무리함에 따라 오랜 번역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출간된 전쟁론 중에서 1998년에 출간된 한 권만 독어판 요약본을 정식으로 번역한 것일 뿐 나머지는 영역판·일역판을 재번역한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번역저본조차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 수준의 의역으로 원본 텍스트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김 박사는 1832년·1833년·1834년에 각각 간행된 독일어 초판본 원전을 기본 텍스트 삼아 1853년에 발행된 제2판의 수정된 내용까지 고려해 번역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심지어 번역에 참조한 영역본과 일역본의 서지사항까지 분명하게 밝힐 정도로 번역에 임하는 김 박사의 태도는 명명백백하다.
판본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역이라는 명분하에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문단이 들고 나갈 정도의 괴이한 수준의 번역이 난무하는 국내 번역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책을 직접 쓰는 것 이상의 품을 들여 성실하게 번역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물론 워낙 난해하기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의 문체나 적절한 한국어 용어를 찾기 힘든 미묘한 독일 군사용어의 특성을 고려하다면 이 책도 오류가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번역이라고 소개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없이 성실한 태도로 클라우제비츠의 독일어 초판본 원전을 충실하게 완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번역본은 한국 군사학계가 거둔 또하나의 성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클라우제비츠의 여러 주장에 어느 것이 본질적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린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담긴 내용 중에는 19세기적 전장 상황에만 타당한 대목이 있는가 하면 시대를 초월해 전쟁의 본질적 속성을 꿰뚫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때문인지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중에서 독자들이 읽을 만한 내용과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을 구별하는 과잉(?) 친절을 베풀 때가 많았다. 원본이 아니라 내용을 재구성한 판본이 널리 보급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주제 넘은 자의적 판단을 포기하고, 독자의 선택에 모든 것을 되돌리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완역본의 진정한 가치일지도 모르겠다. 문의 02-325-1485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