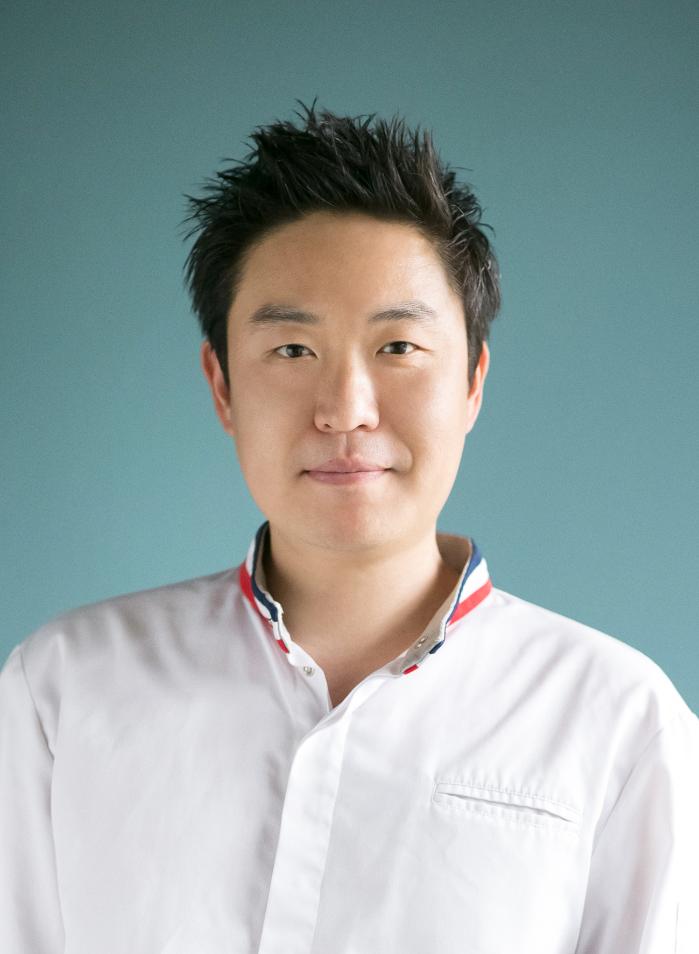 |
칠말팔초. 서울은 모처럼 한산하다. 더위를 쫓는 건지 추억을 좇는 건 지 산과 바다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드디어 한 해를 기다린 휴가철이다. 반복되는 프랩(Prep)과 조리의 루틴에 한 몸처럼 움직이던 주방의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각자의 설렘에 상상의 각개전투를 펼친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보노보를 능가하는 이타적 조직문화가 등장한다. 나의 연일 근무로 너의 1박을 만들어낸다. 죄수의 딜레마와 경제적 게임이론은 열한 달 반은 맞고 보름간은 틀린다. 스케줄표는 정의롭고, 모두는 대타와 가욋일을 투정 없이 버틴다.
불판 앞에 처음 서 본 막내는 요리사의 손에 담겨야 할 긴 시간을 직면하고 치기 어린 교만함을 반성한다. 셰프는 잔반통을 닦으며 어설펐던 시절 땀의 대가로 받은 억울한 핀잔을 떠올린다. 난자리가 가져온 고단함에 상호 존중과 배려를 다짐한다. 물론 다짐만 한다. 처서가 되면 더위는 제집을 찾아 들어가고 검게 그을린 탕아들도 하나둘 제 자리로 복귀한다.
주방의 냉장고에는 천안의 호두과자부터 제주의 감귤초콜릿까지 각자의 기억으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엇박자의 선물들이 가득하다. 오랜만에 모두 모였으니 전우애로 창조한 서로의 시간을 치하하며 포장마차에 둘러앉아 곰장어를 굽는다.
숯불 위에서 껍질을 벗긴 산 곰장어가 꿈틀거린다. 굵은 천일염을 성기게 뿌리면 석쇠에서는 백룡이 하늘로 오르는 듯 한바탕 거센 용오름이 펼쳐진다. 노릇하게 구워진 탄탄한 곰장어의 육질은 윗니와 아랫니를 같은 극의 자석처럼 튕긴다. 야무지고 차진 살바탕에서는 짠맛이 솟구친다.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사이로 몰아치는 파도 같이 또랑또랑한 바다 맛이다. 소금구이 한 판 했으면 이제 매콤하니 맛깔스러운 양념장을 발라 구워야 한다. 애호박 미음이 요람에서 느낀 미식의 첫 속삭임이라면, 희나리 숯불에 살짝 누른 양념장 곰장어는 모든 감각의 끝에서 외치는 맛의 일갈이다.
곰장어는 불판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모양에 그 이름이 붙었다. 곰장어의 원래 명칭은 눈이 멀었다 하여 먹장어다. 붙는 이름마다 구슬프다. 하물며 이 녀석은 장어조차 아니다. 바닷장어와 민물장어는 모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경골어류이고 곰장어는 턱이 없이 입이 둥근 원구류 어족이다. 데리야키 소스의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민물장어는 그나마 선하게 생긴 뱀장어, ‘아나고’라고도 부르는 바닷장어는 날카로운 턱선의 붕장어다. 명실상부 장어의 제왕은 남해안의 갯장어다. 맑은 채수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 먹는 갯장어 샤브샤브(하모 유비끼)는 여름철 최고의 별미다. 도톰히 살이 오른 갯장어에 잔칼집을 내어 살짝 데치면 싸락눈처럼 포슬포슬한 속살을 만날 수 있다.
어느새 불판 위 곰장어는 잠잠해졌다. 언제 뜨거웠냐는 듯이 가을 첫 낙엽처럼 노랗고 붉게 물들며 곱게 익어간다. “옛다” 막내의 앞접시에 바삭하게 구워진 장어 꼬리를 얹는다. 갓 스물의 녀석은 “전 아직 필요 없습니다”라며 너스레를 떤다. 어눌하리만큼 풋풋한 휴가지 여름의 젊은 추억들이 곰장어를 대신해 자못 진지한 안주가 된다. 칠말팔초의 풋사랑은 숯불 위의 곰장어처럼 괴롭고, 여름밤 눈 가리고 먹는 복숭아처럼 달다. 하지만 장어와 복숭아는 같은 날 먹어서는 결코 안된다. 복숭아의 유기산이 장어 기름의 소화를 막아 같이 먹으면 으레 큰 배탈이 난다. 마치 『그해, 여름 손님』의 풋사랑처럼.
이브 몽땅의 샹송으로 유명한 ‘고엽’은 프랑스의 시인 자크 플레베르의 시다. 그는 처서의 첫 찬바람을 맞으며 어제의 여름을 읊었다.
“낙엽과 함께 후회와 회한은 나뒹굴지만, 그해 우리가 부른 서로의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Falling Leaves.”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