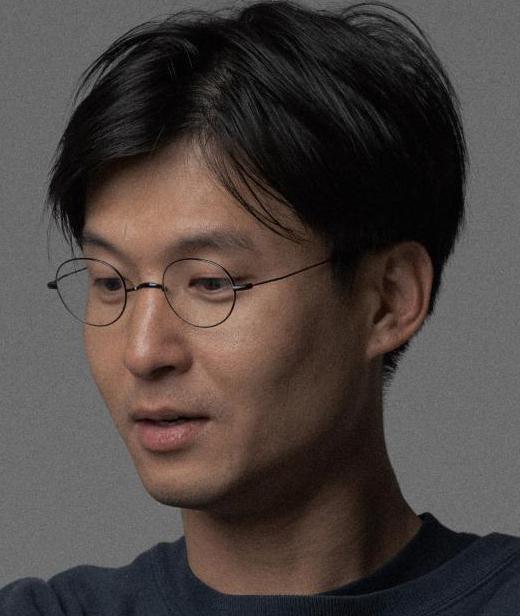 |
군대가 더우면 바깥세상도 덥다. 원고를 적는 지금은 대서고, 서울지역 기온은 36도까지 올랐고, 이정도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에 땀이 샘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내 기억 속 더위 중 군대 더위보다 강력한 더위는 없었다. 군대에서의 일들을 과하게 기억하나 싶어 내가 복무했던 2004년과 2005년의 여름 기온을 찾아보니 실제로 꽤 덥기도 했다. 그 당시 군대 막사에는 에어컨도 없었다. 선풍기 두 대, 열어둔 창문, 당직사관 몰래 TV로 보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과 ‘내이름은 김삼순’으로 더위를 잊어야 했다.
한 번은 여름을 맞아 창고에 파리 잡는 끈끈이를 붙여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창고는 보급계 담당 분야니까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 끈끈이를 붙여두었다. 내가 담당한 보급물자는 식품이 아닌 일반물자라 여름 내내 끈끈이에 붙어 있던 벌레도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창고에 가니 처음 보는 뭔가가 붙어 있었다. 벌레라고 하기엔 너무 컸는데 멀리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본 후에야 정체를 확인했다. 박쥐였다. 잠들 자리를 잘못 잡았는지 거꾸로 매달려 날개를 곱게 접은 채 죽어 있었다. 한반도 자연의 다양성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여름은 자연이 만개하고 나는 군대에서 그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 이파리는 짙은 윤기를 띠며, 부대 곳곳의 잡초도 겁날 정도로 잘 자란다. 그 더위를 뚫고 야간 경계를 나가던 날들도 자연 체험이었다. 초소 주변을 빼면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숲 속에서 종종 새 소리인지 네발짐승 소리인지 모를 울음소리와 동물의 기척이 들렸다.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옛날이야기 속 숲이 신비와 공포의 장소로 묘사되는 이유를 실감하곤 했다.
그 이후 여러 종류의 더위를 겪었다. 나는 국내외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사소한 기사를 진행하는 잡지 에디터라는 일을 하게 됐다. 이것도 일이라, 하기로 정해진 일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해내야 한다. 온종일 뜨거운 물수건이 내 몸에 감겨 있는 것 같은 동남아의 더위도, 계속 몸에 흙먼지가 쌓이는 듯한 라스베이거스 사막의 더위도 겪어 보았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곳에서 겪은 더위 중 어떤 것도 군대 더위 만한 건 없었다. 장병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의 시골은 그만큼 덥고, 군대에서는 개개인의 쾌적한 생활보다 우선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너무 옛날 아저씨 이야기인가 싶어 찾아본 후 요즘 군대에 에어컨이 설치됐음을 알게 됐다. 그렇다고 군대가 안 더울 리 없다. 내가 아는 한, 대부분 육군 병사의 일과는 실외에서 이루어진다. 혹서기 휴식 등을 고려해도 가장 더울 때 밖에 있어야 한다. 한국의 시골은 전방이든 후방이든 그곳을 모르는 사람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운 곳이다. 국방의 의무를 떠나 개인 단위로 생각해본다면 한국 군대는 인간의 기후 체험 훈련인가 싶기도 하다. 여름 군대는 인생의 혹서기 훈련이다.
그 뜨거운 여름과 자연이 종종 생각난다. 여름이 뜨거운 만큼 사방의 모든 자연이 싱싱했고, 그 안의 나와 내 전우들도 뜨거운 여름 속 싱싱한 젊음이었다. 의무 복무의 모든 기간이 즐겁기만 할 순 없지만 젊은 우리는 그때의 시간도 잘 지낼 수 있을 만큼은 유쾌했고 강했다. 군대의 여름과 더위를 먼저 겪은 사람 입장으로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는 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상으로 더운 시간은 없다. 이제 여러분은 무슨 더위든 견딜 수 있다. 더위 내구성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올여름을 잘 견뎌 내시길 바란다.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