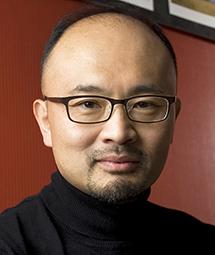 |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몇 년간 직장에 다녔던 적이 있다. 이왕 미국 생활을 시작했으니 여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마침 근처 작은 공항에 민간 비행학교가 있어 덜컥 수강등록을 했다. 교관은 미국 해병대 수송기 조종사 출신의 할아버지였다. 작은 체구, 조용한 목소리,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매의 소유자였다.
첫날 인사를 마치자마자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타라고 했다. 바로 비행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비행기 타러 온 거 아니에요?”라고 되레 물었다. 그건 맞지만 이론 수업이라도 먼저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말도 그렇게 탈래요?” 군말 없이 비행기에 탔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첫 비행의 기억은 아직도 그렇게 짜릿하게 남아있다.
비행은 원래 학생 혼자 배우는 것인데 교관은 사고 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비행기만 다룰 줄 안다고 좋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항공 분야 전반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정비하는 사람, 관제탑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만나 이야기해볼 기회를 줬다. 정비창 바닥이 먼지 하나 없는 백색 페인트 마감이었던 것은 카센터 정도를 생각했던 처지에서 큰 충격이었다.
“정비 끝났는데 볼트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 비행기는 떨어지니까요”라는 설명이었다. 관제탑에서는 “며칠 전 엉터리로 교신하던 게 당신이군요?”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줬다.
시간 나면 다시 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구경하라고도 했다. 다들 친절했고 학교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선생님들 같았다.
그런데 무덤덤한 그 교관이 한 번 정색하고 말한 적이 있었다. 놀랍게도 비행할 때는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항상 두리번두리번하며 주변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학교와 사회에서 들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딴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배워오지 않았던가. 교관은 “그래서 모범생들이 비행을 힘들어하지요”라며 싱긋 웃었다. 그날 그가 한 이야기는 결국 ‘상황인식’에 관한 것이었다.
속도계만 보다가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관제탑과의 교신에만 신경 쓰다가 주변의 다른 비행기를 못 보거나, 경로만 생각하다가 연료계를 못 읽거나 하는 실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얘기해 주었다.
“따지고 보면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라면서. 생각보다 일찍 귀국하게 되면서 비행훈련은 도중에 그만뒀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교관과의 이별이 가장 서운했다. 한국에서도 계속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비행에 대한 미련은 그 이후로 접었지만, ‘상황인식’이라는 개념은 이후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아직도 그 교관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도 계속 주변을 살피며 삶이라는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