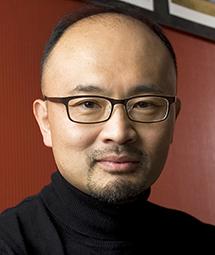|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시대가 바뀌면 사라진다. 슬퍼할 필요도 없다.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어디에선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라져 가는 전통 중 하나가 좌식문화다. 동네의 허름한 밥집은 물론 유명 음식점에서도 바닥에 앉는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다. 나 또한 바닥보다 의자에 앉는 것을 더 좋아한다. 좌식문화는 17세기에 온돌이 보편화하면서 생긴 것이다. 치열한 서구식 근대화 과정에서도 용케 살아남은 좌식문화가 이렇게 사라져 가는 상황에는 아쉬움과 비장함이 있다.
좌식문화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이자 결과겠지만 입식문화가 보급되면서 바닥에 앉는, 특히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것은 갈수록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 일이 됐다. 소위 ‘옆 골반이 터지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자세다. 외국인에게 좌식으로 앉으라고 하면 무릎을 바닥에 붙이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곤 하는데 요즘은 한국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의복이다. 전통 한복은 헐렁헐렁해 바닥에 앉을 때 불편함이 없었다. 근대화 이후에도 그 영향이 남아있었다. 일례로 오래전 한국을 찾은 한 유명한 외국 패션디자이너가 한국의 첫인상에 대해 “다들 한두 치수 큰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옷을 꼭 끼게 입는 추세다. 당연히 바닥에 앉기가 쉽지 않다. 다리가 저리거나 옷이 늘어나기도 한다. 발 냄새를 신경 쓰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위생 개념의 변화도 있다. 물론 흙 묻은 신발을 신고 실내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위생적이겠지만, 그래도 좌식문화는 관점에 따라 꺼려지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교가 외국 교환학생에게 좌식 기숙사를 배정했다가 항의를 받고 방을 바꿔준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발로 밟고 다니던 곳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라는 것이냐”는 항의였다고 한다. 당황스럽지만 막상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
현대의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일종의 현명한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또 다른 전통은 여전히 유지하되, 좌식보다는 입식을 선호하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 동부나 북유럽 같은 곳에서도 이런 생활방식이 어느 정도 발견된다. 즉 집에 오면 신발은 벗되, 바닥에 앉지는 않는 것이다. 한국의 병영에서도 이제 좌식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대로 좌식문화가 소멸할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고급문화의 한 형태로 다시 화려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바닥에 제대로 앉을 줄 아느냐?’가 고상함을 가르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거나 생선회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글로벌한 품위의 기준이 된 것과도 같다. 이처럼 일상에서 이탈한 전통이 어느 정도의 휴지기 이후 새로운 맥락에서 고급화돼 다시 등장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막사발, 달항아리, 한복, 한옥이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거나 혹은 거치고 있다. 좌식문화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