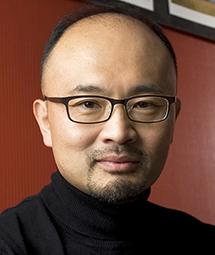 |
낯선 문을 열 때 느끼는 가벼운 흥분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다. 이 문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이 짜릿한 긴장과 호기심의 순간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아 조금 더 그 앞에서 서성거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문 앞에서 머뭇거렸을까. 새로 기숙사를 찾아온 학생, 자대배치를 받고 생활관 앞에 선 군인, 면접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취업준비생,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랑과 신부 등. 인류의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낯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삶의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연다. 문손잡이는 작지만 단단하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덜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다. 그 견고함은 문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일반적인 문에 비해 두세 배는 무거운 것 같았다. 힘들게 열리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처럼 묵직하게 닫혔다. 짐을 끌고 들어가니 아주 소박한 방이었다. 수도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어쨌든 여기가 앞으로 내가 일주일간 머물 곳이었다.
현대 사회는 유목민 정서를 강조하지만, 나는 아쉽게도 정주형(定住型) 인간이다. ‘하루를 묵어도 내 집처럼’이 평소 나의 좌우명이다. 가방을 풀고 짐을 꺼내면서 옷장이며 수납장을 둘러본다. 1인실이라 모든 것은 딱 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도만 있다. 옷걸이에 옷을 걸고, 책상 위에 작업 도구들을 배열하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세면 용구들을 늘어놓고 나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방을 관찰한다. 정말 필요한 것만 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겼지만 편안해 보이는 소파 하나. 자세히 보면 재료가 통일돼 있다. 자작나무와 흰색 래미네이트가 재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벽과 천장은 하얗고 가구도 마찬가지다. 책상에 하나, 침대 옆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 놓여 있는 전등은 너무도 평범하게 생겨서 언젠가 다시 봐도 절대 못 알아볼 것 같다.
창문을 열어본다. 대부분 창이 바깥으로 열리는 한국과 달리 여기서는 창문이 안으로 열린다. 역시 손잡이는 작지만 견고하고 전혀 덜렁거림이 없다. 창밖의 경치는 특별히 대단하지는 않아도 멀리 바다가 보이고, 한적한 거리에 가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인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고, 공기는 차고 맑으며, 곳곳에 칠해져 있는 색깔이 유난히 도드라진다.
여기는 핀란드의 헬싱키. 유럽 전체로 보면 변방일지 모르지만, 현대 디자인의 역사로 보면 세계 최강 도시 중 하나다. 그 나라의 한 대학을 방문하면서 머물게 된 숙소는 이렇게 처음에는 수더분하게 다가왔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깊이와 내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묵어본 그 어떤 호텔 방도 이런 친밀한 편안함을 준 적은 없었다. 지구 반대편을 돌아온 이방인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진정한 실력은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소박하기 짝이 없는 대학 숙소에서 느끼게 될 줄이야. 그 낯선 문 뒤에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었다.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